그동안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만나왔습니다. 현장을 방문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느낀 점을 오늘부터 차례로 [탄희의 일기]라는 제목으로 게시하려 합니다.
우리 근처의 이야기, 당신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탄희의 일기1]
“남편이 건설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했어요.”
어머니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애들 셋을 낳은 데다 막내가 장애가 있어 돈을 모으질 못했어요.
한 달 벌어 한 달 먹고사는 인생이었는데, 코로나 1년에 다 무너졌어요.
건설 현장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니까 현장 자체가 줄고, 거기에 자영업자들이 투잡이라도 뛰려고 인력시장 나오고... 일거리가 없으니까 남편이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지방까지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작년 겨울부턴 그런 일도 없어서 수입이 완전히 끊겼어요. 반년 정도 됐네요...” 방 2개의 좁은 집. 코로나로 집에 갇힌 5인 가족은 하나둘 아프기 시작했다.
어린 막내 딸은 뇌전증이 왔다. 입에 거품을 물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 무서웠다. 구급차를 불러서 가까운 병원으로 갔는데 때마침 의사들이 파업 중이었다.
응급실 의사가 성의 없이 “아줌마. 안 죽어요. 뇌전증이에요. 저러다 말아요.”라고 했다. 그래도 어머니는 무섭고 자꾸 눈물이 나와서 잠깐이라도 봐 달라고 했다.
누군가 병실이 났다며 수원의 다른 병원을 소개해줬다. 없는 돈에 사설 구급차를 불러 그곳으로 갔다. 그 병원도 별 수 없다며 서울 강북의 한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
그곳에서 겨우 진료를 받았지만 입원은 안된다며 돌아가라고 했다. 새벽 3시에 아이를 데리고 용인 집으로 돌아왔다.
오자마자 또 아이가 거품을 물어서 바로 서울의 병원으로 다시 와야만 했다. 병원에 도착하니 아침 7시였다.
원래 인지장애가 있던 아이였다.
상담도 받고 언어교육도 받았는데, 센터까지 아이를 안고 버스로 오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그나마 다행이었다.
교육청 바우처가 큰 힘이 됐다. 어머니 이야기를 들으며 막내 아이를 쳐다보니 눈을 잘 마주치질 않는다. 나이에 비해 유난히 작고 귀엽다는 생각이 든다.
경제적인 압박이 심해지면 아이들도 그걸 본능적으로 느낀다고 한다.
둘째 딸 아이도 공황장애가 와서 힘들어 하고 있고, 어머니는 자궁내막염으로 병원에서는 2달 마다 검진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냥 안 가고 있다.
부채가 한도 끝까지 차오른 상태라 병원비가 무섭다고 하신다. 의료급여 말씀을 드리니 서류가 많아서 엄두가 안 난다고 하셨다.
다행히 아이들은 도움을 따로 받고 있었다. 그마저 없었으면 이미 사고가 났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헤어지기 전 큰 아들과 대화할 수 있었다. 군대 다녀와서 일자리 구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었다. 교수님 통해 소개받은 일을 잘 처리해야 좋게 봐주지 않겠냐며 새벽까지 작업을 한다고 했다. 일부러 기다렸다고, 괜히 희망이 생긴다고 늠름하게 이야기하는데 그 말을 듣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미안하다.
우리는 국가가 나눠질 짐을 개인에게 떠 넘기고 있다. 지난 주 한국은행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가 할퀴고 간 지난 해 우리나라의 빈부격차는 크게 악화되었다.
특히 소득 하위 20%의 소득하락폭이 평균의 5배를 넘었다. 일용직 노동자들이 대거 일자리를 잃었다.
우리는 작년 총선 직후, 대공황 때 미국 중산층의 기반을 마련한 미국 민주당과 루즈벨트의 정책을 많이 이야기했다. 하지만 그 후, 정작 OECD국가들이 피해지원/경기부양에 GDP 평균 12% 정도를 쓰는 동안 우리는 그 1/4 수준인 3% 정도를 썼다.
그 덕에 국가부채는 별로 없지만 가계부채는 폭증했다. 민주당은 서민의 정당이어야 한다. 결단코 그래야 한다. 내 생각은 그렇다. 서민의 아픔을 걷어내고 눈물을 닦아줘야 한다. 성과는 여기서 나온다. 과연 우리는 그런 성과를 내고 있는가.
 당근마켓이 아니라 당근탄희? ㅎㅎ[3]
당근마켓이 아니라 당근탄희? ㅎㅎ[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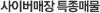








































0/2000자